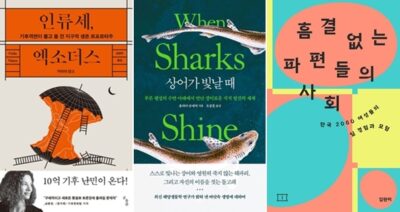‘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는 만능이다. 이 버튼 하나로 여러 게시물에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돈도 들지 않는다.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이라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느낌까지 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무심히 클릭한 디지털 정보들은 해저케이블과 데이터센터를 거쳐 전 세계에 공유된다. 무형의 디지털 행위가 ‘탈물질화’됐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굉장히 육중한 물리적 실체라는 것이다. 책은 디지털 세계를 구성하는 거대 인프라를 탐사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기 위해 기업과 강대국들이 벌이는 영유권 전쟁의을 파헤친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디지털 세계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끌어들인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는 깨끗한 흰 구름이 아닌 검은 먹구름에 가깝다는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근 데이터센터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이름처럼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 초연결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읽어야 하는 필독서다.
기욤 피트롱 지음,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1만8500원, 364쪽

상실의 기쁨
모순적 제목의 책. 누군가와 헤어지고, 무언가를 잃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저자 프랭크 브루니는 ‘상실’이 오히려 삶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20년 이상 뉴욕타임스의 간판 칼럼니스트로 명성을 쌓았다. 백악관 담당 기자, 이탈리아 로마 지국장을 역임하고 음식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온 뇌졸중으로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끊겨 점점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다. 그의 나이 52살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연인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고했고,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시력 저하로 수차례 발을 헛디뎠고 적잖이 넘어졌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춰 과거를 되짚으며 스스로에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정서적 해협을 항해했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그는 이렇게 묻는다. “어느 누구도 상실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 없이, 상처받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슬픔과 공포에 굴복할 것인가요, 아니면 의식적이고 구체적인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요.”
프랭크 브루니 지음, 홍정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1만8000원, 412쪽

이웃집 방문 프로젝트
케이크 200개로 독일 베를린에서 ‘인싸’가 된 워킹맘의 에세이. 독일 니더바이에른현의 작은 도시 에겐펠덴에서 나고 자란 슈테파니 크비터러는 출산 직전 남편을 따라 베를린 구동독 지역으로 이주했다. 아는 이 한명 없는 대도시 베를린에서 외로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내던 그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가보기로 한다. 목표는 200일 동안 케이크 200개를 구워 들고 200가정을 방문하는 것. 크비터러는 빨간모자 소녀처럼 바구니에 케이크, 커피, 코코아 등을 담아 이웃의 초인종을 눌렸다.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가 그를 훑었다. 하지만 그는 주눅 들지 않고 이웃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이내 활짝 열린 문 너머에는 아이와 노인, 원주민과 이주민 등 다양한 이웃의 진솔한 면모가 숨어있었다. 조기 퇴직하고 약초 공부를 하는 여인, 매트리스와 그랜드피아노밖에 없는 집에서 사는 음악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국경을 넘어 사랑을 나눈 이들의 얘기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 집안에서 육아만 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보내던 그가 엄마로서의 삶뿐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초인종 2938번을 눌러 만난 200여명의 이웃과 행복한 워킹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슈테파니 크비터러 지음, 김해생 옮김, 문학동네, 1만6000원, 284쪽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