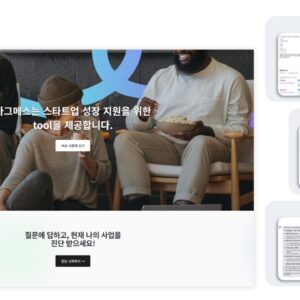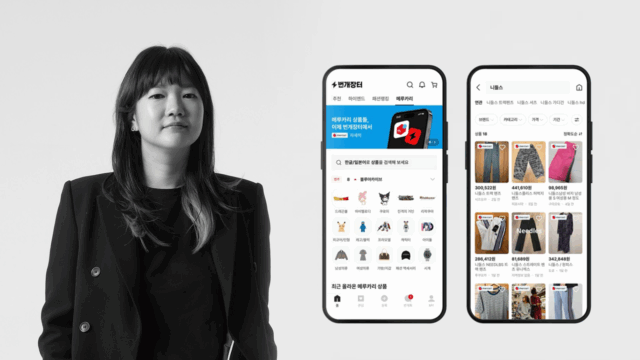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연간 2000마리 동물 구조
치료·훈련 거친 방사율 40%
오후 2시30분, 새끼 고라니 한 마리가 센터로 들어왔다.
“차량 충돌로 두 뒷다리 모두 탈골됐습니다. 왼쪽 다리 인대도 부상입은 것 같아요.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취제를 주입하고 곧바로 수술이 시작했다. 고라니 뒷다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도로 위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새끼 고라니는 앞으로 몇 달간 이곳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지난 18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충남 지역에서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기관이다. 수의사 3명과 재활관리사 6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충남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19곳이 있다.
연간 구조 동물 2000마리… 방사율은 40%
센터에는 한 해 2000마리 넘는 동물들이 접수된다. 피해 상황은 제각각이다. 유리창 충돌, 밀렵, 농약 중독 등 다양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접수 동물은 2082마리에서 2022년 2525마리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253마리가 이곳을 거쳤다. 특히 번식기인 여름은 구조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한 해 구조 동물의 절반이 이때 몰린다. 하루 30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센터로 밀고 들어올 때도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보호 중인 동물들의 먹이를 챙기는 일부터 간단치 않았다. 특히 새끼 새는 수시로 먹이를 줘야 한다. 배변 역시 사람이 직접 항문을 자극해 유도하다 보니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다. 개체별 특성에 따라, 사육환경이 제각각인 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늘어난다. 가장 어려운 지점은 야생동물들이 아플 때다. 야생성이 강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아픈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빈틈을 보이면 바로 공격 당하는 야생의 섭리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정병길 재활관리사는 “맹금류 새끼가 기아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인데도, 겉으로 봤을 때는 아픈 티가 전혀 나지 않았다”라며 “그만큼 동물들의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바라보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동물 치료실로 자리를 옮겼다. 멸종위기종 2급인 수리부엉이가 날개를 부풀리며 ‘딱딱’ 경계음을 냈다. 실내 모든 계류장은 담요로 덮어져 있었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어린 개체의 경우, 인간과 친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먹이를 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한다. 구조된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치료한 사람을 가열차게 물거나 할퀴려고 할수록 직원들은 오히려 기뻐한다.
센터에서 꾸준한 치료와 돌봄을 받은 후에 비행 실력, 먹이활동 등 방생 요구 조건들을 통과하면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방사할 때는 가능한 구조된 지역 주변에 방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곳에 서식지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동물 중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비율은 40%. 보통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상태로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야생동물과 교감은 생존에 치명적 영향
구조와 치료 과정에서 인간을 따르거나 상처가 심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교육 동물’로 센터에 머무는 너구리 ‘너울’의 이야기다. 정병길 재활관리사가 ‘너울’하고 이름을 부르자 철장 사이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사람 발소리만 들려도 소리를 지르던 다른 동물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너울이는 새끼 때 사람의 손에 1년6개월의 사육당하면서 야생성을 잃었다.
“야생동물을 기르는 행동이 흔히 미화되곤 하지만,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병길 재활관리사는 “야생동물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먹이와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성장이 빠른 새의 경우에는 제공해야 하는 먹이가 수시로 바뀌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도심 아파트 실외기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기도 하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의 경우 이러한 ‘부적절한 사육’에 쉽게 노출된다.
“일반인이 황조롱이에게 돼지 생고기만을 먹이로 지급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기르다 보니 햇빛을 제대로 볼 수도, 날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고요. 구조를 갔을 때 깃털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뼈가 약해져 구루병을 앓고 있던 것이죠.”
대부분 야생동물은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 로드킬 등 사람에 의해 다쳐 구조된다. 야생동물은 한 번 상처가 나면 치료가 까다롭다. 특히 고라니 같은 사슴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풀리게 되는데, 상처 없이 그물에 걸리기만 해도 수 시간 만에 스트레스로 급사하기도 한다. 애초에 ‘구조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활발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병길 재활관리사는 “야생동물은 눈에 띄지 않을 뿐 인간의 생활권 내 어딘가 살고 있고, 삶의 희로애락이 있는 존재”라며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조영은 청년기자(청세담14기)